<한국인의 DNA를 찾아서>‘우리’의 응집력…위기마다 빛났다
2011-01-06 10:49
금모으기·태안 복구…
민족의 집단 에너지 발휘
전세계가 ‘경이의 대상’
기마민족의 여정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착생활이 아니라서 일정한 곳에 방벽을 쌓는 것도 아니기에 늘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약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므로 동ㆍ식물, 사물, 인간, 천문, 기상에 대한 탐구 욕구는 어느 민족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를 누비던 한민족에게 이 같은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진 듯하다. 6ㆍ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오늘의 성과를 이룬 한국현대사는 ‘열정 DNA’ 발현의 역사이기도 하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에너지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건국대 사학과 한상도 교수는 “다른 민족보다 인구도 적고, 숱하게 외세의 침입을 받는 와중에 고유의 문자와 언어를 보유할 정도로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와 책임의식, 뜨거운 에너지 등 열정의 발현이 고유의 문화 창달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 제철소를 지었다가 지금은 일본을 추월한 철강산업이 그렇고,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산업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단기간 이룩한 IT강국의 위상 등은 열정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걸작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와 가요 등 대중문화계에 부는 ‘한류 열풍’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을 넓히고 있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할 때에만 해도 한국 대중문화의 자생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10년이 지나고 상황은 보기 좋게 역전됐다. 권상우가 출연한 드라마 ‘대물’은 한국에서 방영되기도 전에 일본에 판권이 판매됐고, 한류스타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인 일본 아키타는 드라마에 매료된 한류 팬들로 인해 특수를 누릴 정도였다.
피겨의 불모지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김연아는 전무후무한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의 여왕이 됐다. 내홍과 침탈, 전쟁을 겪는 동안 생존본능과 함께 더욱 과도해진 기성세대의 열정과는 달리, 글로벌 G세대는 ‘겁 없이 즐기는 열정’으로 새로 옷을 갈아입는다.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박태환의 ‘음악 들으며 즐기는 수영’은 두려울 것 없어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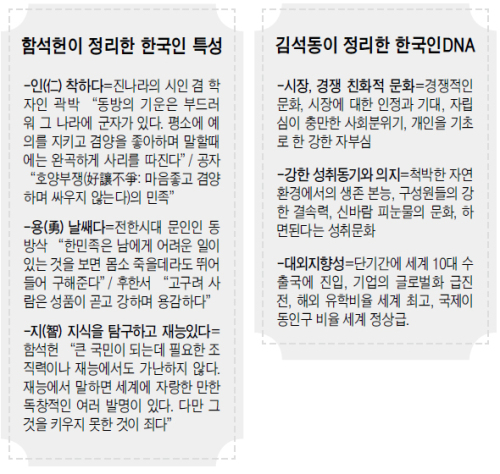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와 ‘2009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OECD 국가 평균(고교 71%ㆍ대학 28%)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경우 고교 이수율은 무려 98%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대학 이수율도 58%로 2009년 1위 캐나다(56%)를 제쳤다.
결국 이 같은 노력은 결과로 나왔다. ‘PISA 2009’ 분석 결과 한국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에 들었다. 읽기와 수학 평균점수는 각각 539점, 54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과학(538점)은 핀란드(554점), 일본(539점)에 이어 3위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영어교사까지 외국에서 들여온다”며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빗나간 열기는 문제로 지적된다.
민족의 집단 에너지 발휘
전세계가 ‘경이의 대상’
기마민족의 여정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정착생활이 아니라서 일정한 곳에 방벽을 쌓는 것도 아니기에 늘 사람이 중심이 되어 만약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므로 동ㆍ식물, 사물, 인간, 천문, 기상에 대한 탐구 욕구는 어느 민족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중앙아시아를 누비던 한민족에게 이 같은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길러진 듯하다. 6ㆍ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오늘의 성과를 이룬 한국현대사는 ‘열정 DNA’ 발현의 역사이기도 하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인의 에너지는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성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 한국민의 공동체 의식이 퇴색됐다는 분석은 태안 기름유출사건을 계기로 설득력을 잃었다. 130만명의 국민이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 기름유출 회복 및 자원봉사 수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헤럴드경제DB] |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 제철소를 지었다가 지금은 일본을 추월한 철강산업이 그렇고,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산업동맥 경부고속도로 건설, 단기간 이룩한 IT강국의 위상 등은 열정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걸작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드라마와 가요 등 대중문화계에 부는 ‘한류 열풍’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영향을 넓히고 있다. 1998년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할 때에만 해도 한국 대중문화의 자생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10년이 지나고 상황은 보기 좋게 역전됐다. 권상우가 출연한 드라마 ‘대물’은 한국에서 방영되기도 전에 일본에 판권이 판매됐고, 한류스타 이병헌이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인 일본 아키타는 드라마에 매료된 한류 팬들로 인해 특수를 누릴 정도였다.
피겨의 불모지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김연아는 전무후무한 세계신기록으로 올림픽의 여왕이 됐다. 내홍과 침탈, 전쟁을 겪는 동안 생존본능과 함께 더욱 과도해진 기성세대의 열정과는 달리, 글로벌 G세대는 ‘겁 없이 즐기는 열정’으로 새로 옷을 갈아입는다. 체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박태환의 ‘음악 들으며 즐기는 수영’은 두려울 것 없어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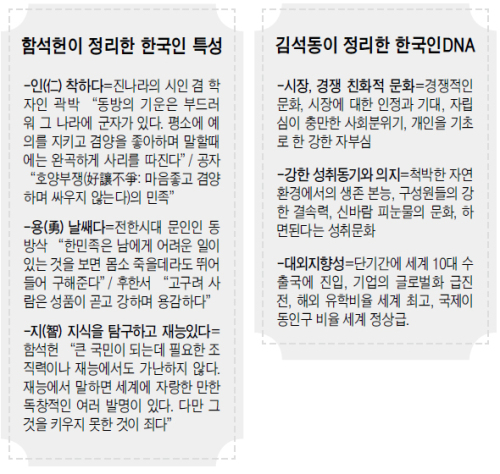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와 ‘2009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교 이수율(79%)과 대학 이수율(37%)은 OECD 국가 평균(고교 71%ㆍ대학 28%)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경우 고교 이수율은 무려 98%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대학 이수율도 58%로 2009년 1위 캐나다(56%)를 제쳤다.
결국 이 같은 노력은 결과로 나왔다. ‘PISA 2009’ 분석 결과 한국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에 들었다. 읽기와 수학 평균점수는 각각 539점, 546점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과학(538점)은 핀란드(554점), 일본(539점)에 이어 3위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영어교사까지 외국에서 들여온다”며 여러 차례 한국의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빗나간 열기는 문제로 지적된다.
'한일관계 > 동북아민족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리안DNA1> 자랑스런 역사로 돌아본 한민족의 기질 (0) | 2011.01.06 |
|---|---|
| <코리안DNA2> 서희, 구하라, 이건희, 여민지 승리의 DNA (0) | 2011.01.06 |
| <코리안DNA4> 세계가 놀란 열정의 DNA (0) | 2011.01.06 |
| 한국인엔 특별한 DNA가 있다 (0) | 2011.01.06 |
| <한국인의 DNA를 찾아서>대륙 호령한 기마민족…‘노마드의 피’ (0) | 2011.01.06 |